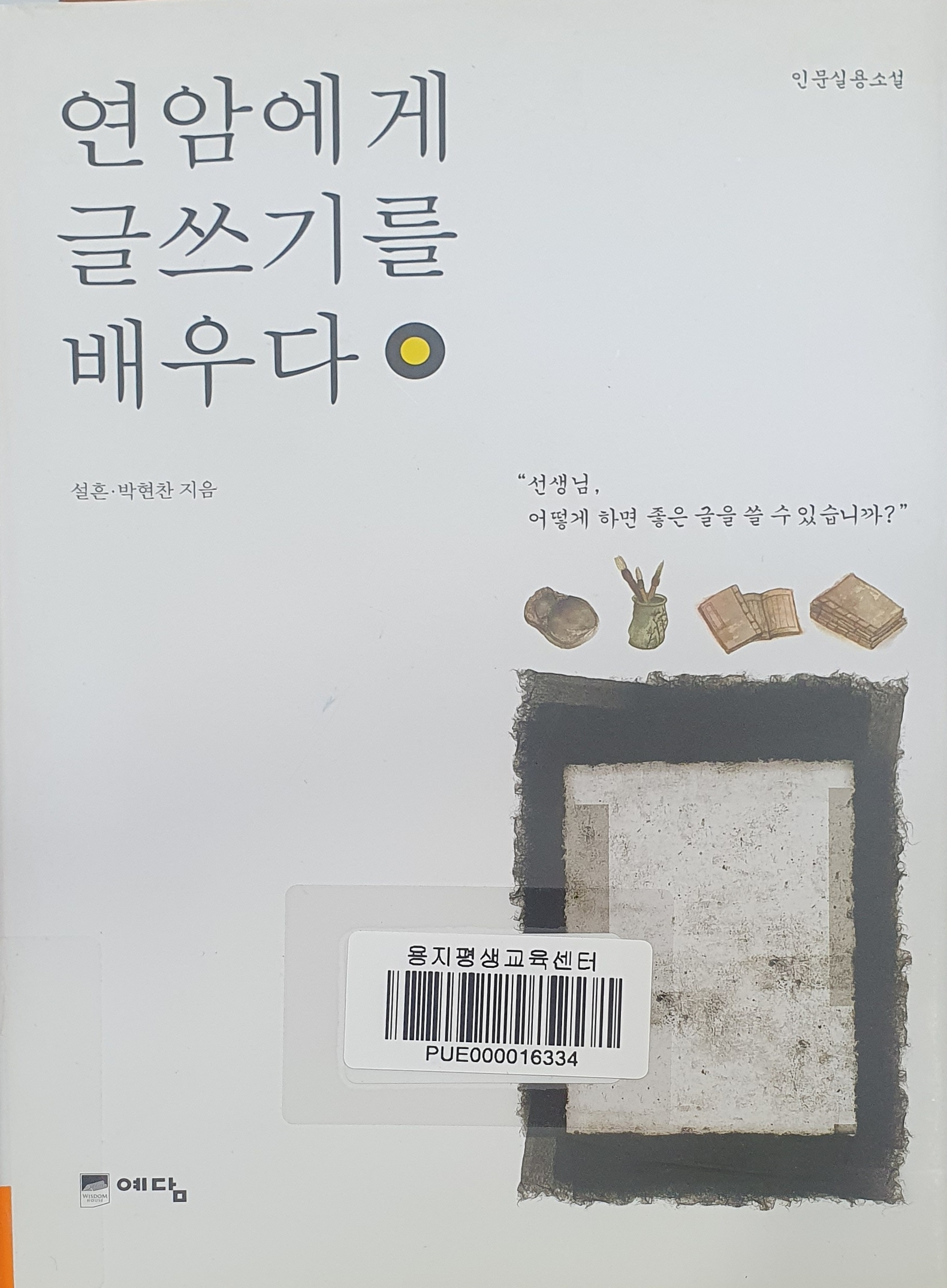
연암에게 글쓰기를 배우다.
설흔, 박현찬 지음
예닮
2007년
연암이 말하는 글쓰기 법칙
1. 정밀하게 독서하라.
2. 관찰하고 통찰하라.
(법고의 묘)
3. 원칙을 따르되 적절하게 변통하여 뜻을 전달하라.
(법고창신의 묘)
4. '사이'의 통합적 관점을 만들라.
(사이의 묘)
5. 11가지 실전수칙을 실천하라.
이치 : 전체 틀
- 명확한 주제 의식을 가져라.
- 제목의 의도를 파악하라.
혜경 : 구성 방식
- 단락간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라.
- 인과관계에 유의하라.
- 시작과 마무리를 잘하라.
요령 : 세부 표현
- 사례를 적절히 인용하라.
- 운율과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더하라.
- 참신한 비유를 사용하라.
- 반전의 묘미를 살려라.
- 함축의 묘미를 살려라.
- 여운을 남겨라.
6. 분발심을 잊지 말라.
ㅁ 등장인물
풍고 김조순 - 초희
초정 박제가 - 이연수
사마천
연암 조부 장간공
경주 김가 중현
유한준
만주
돈환
지문
연암 박지원 - 둘째 아들 종채 - 아내
남공철
이서구
백동수
김향서 - 지문
유득공 유금
백호 임제
형암 이덕무
덕보 홍대용
한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잘 읽어야 한다.
잘 읽는다는 것은 책에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핵심을 꿰뚫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독이 좋은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써본다.
운동을 배우던 악기를 배우던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는 없다.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쌓이고 익숙해져서 어느덧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암은 당시에 소설을 썼다.
조선시대의 소설은 문장가 내에서는 천박한 평을 받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에 주목받는 것 같다.
시대의 주류가 어느 분야 인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드라마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이야기의 빠른 전개속도와 예측을 불어하는 반전은 인기 드라마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한두 번 끄적거려 따고 해서 나의 글 솜씨가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 나 이런 책들을 통하여 계속 나를 단련한다면 언젠가는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은 어떻게 될까?
아내는 큐티가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명신
독서에 푹 젖어야 한다.
책이 쉬웠다. 재밌다.
행간과 통찰은 무엇인가?
바라보는 시선은 아닐까?
생각하기가 필요하다.
붉은 까마귀(저고)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여러 본질중에 검은 색만 보고 있는 것이다.
성장에 밑바탕은 책읽기가 중요하고 생각의 기초가 된다.
정약용은 한곳을 깊이 파면 다른 것이 모두 통한다고 말했다.
인문학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가 모두 연동된다.
나의 글을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면 내가 잘못쓰는 것이다.
예쁜 글이 좋은 글은 아니다.
솔직 담백하지만 좋은 글을 쓰고 싶다.
글쓰기를 하되 일기를 써야겠다.
앞으로 10년 일기를 쭉 써 봐야겠다.
실천에서는 비유를 활용하여 글쓰기 하는 것에 설레였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설레는 마음으로 써내려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미선
전자책 크레마가 있다.
정독을 했다.
요즘책은 정독이 안될 정도로 문장이 가볍다.
읽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써봐야 한다.
'노션'이라는 앱이 있다.
글을 적으면 분류가 된다.
글쓰기가 인공지능이 도와준다.
글을 읽으면 마인드 맵을 했었다.
책 내용으로 시대 배경, 글쓰기 등을 찾아본다.
천주교 탄압(신유박해), 안동 김씨, 경주 김씨, 노론, 소론 등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확장했다.
스토리보드를 그려나가듯이 인물을 그려 그림 한장을 봐도 책이 보이게 그려봤다.
시놉시스를 만들어 내용을 구성하듯 소설을 보고 거꾸로 분석을 하는 형식을 적용해 봐야겠다.
김지문이 어떠하게 생겼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것을 묘사하는 것을 글로 표현해야겠다.
그리고 단어장을 만들어야 겠다.
우우량량, 법고, 성귤당.. , 자송문, 국구, 석치
일기를 써야겠다.
치유가 있다.
일기가 공개되면서 자유하지 못해 안쓰게 되었다.
영어성경으로 본 나병환자의 이야기가 다른 시각으로 보였다.
박지원은 조선시대의 하부르타와 같다.
예수님도 비유로 가르친다.
경서를 하루에 한장 천천히 읽는다.
글쓰기는 스스로 알아 익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글을 제공해도 참조만 할 뿐이다.
이 글의 절정은 중현이 연암의 가짜편지를 가지고 온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엷자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
연암은 마지막에 깨끗이 목욕 씻겨달라고 했다.
사마천은 유업을 잇기 위해 형벌을 받고도 끝까지 글을 썼다.
선비는 글쓰기를 하는 것인데, 과거 입시에 매에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기연
일기쓰기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
자세히 천천히 깊이있게 읽는다.
몰입한다.
책을 읽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드라마의 명언이 있다.
지나
아들이 학교에서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 글을 보니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
일기도 3인칭으로 쓴다.
또는 사물에 대한 1인칭으로 쓴다.
그렇게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같은 글을 보아도 각자의 관점과 배경으로 보는 것 느끼는 것 표현하는 것이 다 다르다.
스승에 대한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되돌려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계속 보여지는 마음의 울림이 있다.
그림)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내려다 본 것은> 제임스 티소 James Tissot, 1890, 브루쿨린 뮤지엄
그림에서 어떤 시선으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모든 책이 다 그렇지는 않았다.
철학자는 모든 분야를 통찰하는 것 같다.
사이의 묘미가 느껴진다.
그 사이를 깊이 생각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
돌보는 발달장애인 중 한명이 같은 단어를 하루종일 한다.
그 단어를 통해 그의 삶을 유추해서 해석해야 하지만 소통이 어렵다.
단어를 듣고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말하고 싶은게 뭘까하면 그 주변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하면 그 아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 수 있겠다.
직무의 진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단어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줄까하는 생각을 한다.
진짜 중한 것에 대해 집중한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롭게 재해석한 이솝우화전집 - 송경원 옮김 (0) | 2023.06.01 |
|---|---|
| 비만코드 - 제이슨 펑 지음 / 제효영 옮김 / 시그마북스 (0) | 2023.03.24 |
| 책 :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 게리 바이너척 지음, 우태영 옮김 / 씨엔에이치북스 / 2022년 (0) | 2022.11.11 |
| 책 : 배철현의 위대한 리더 - 배철현 / (주)살림출판사 / 2019년 (2) | 2022.10.29 |
| 책 : 그릿 - 앤절라 더크워스 지음, 김미정 옮김 / (주) 비즈니스북스 / 2016년 (0) | 2022.10.10 |


댓글